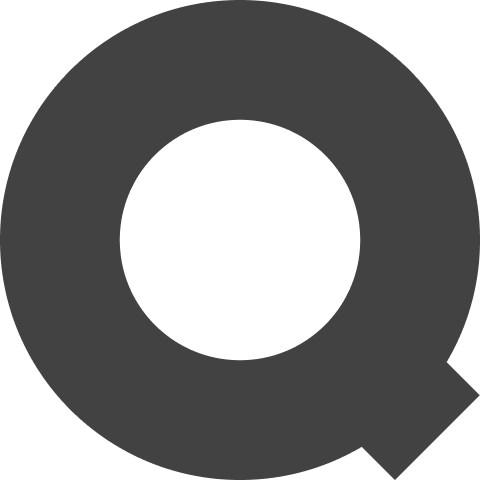미형의 수식어에 관한 고찰
설정2025-10-10 17:38•조회 51•댓글 4•depr3ssed
아아, 이쪽 사람들은 이런 취향인가요? 라는 물음이 바로 튀어나올 정도로, 사람들은 단어 앞에 꾸미는 말이 많아질수록—이런 식으로 문장의 길이가 그로 인해 점점 길어지더라도—그 글을 더 좋아하는 경향이 있는 듯하다. 예를 들면 ‘봄바람에 두 그루의 등나무가 흔들렸다.’ 라는 문장을 표현한다고 해보자. 그렇다면 이쪽 사람들은 밋밋하고 조미료 하나 들어가지 않은 저런 문장보다는 ‘봄을 알리는 전령이라도 돌아온 듯, 강가에는 시원하면서 따뜻한 봄을 머금은 바람이 흔들리고 있었으므로, 그를 반기듯 두 그루의 아름다운 연보라색 옷을 입은 꽃들을 단 등나무들은 마치 꽃을 구경하는 연인들처럼 바람의 속삭임 아래 너울거렸다.’ 같은 말을 더 좋아한다는 것이다. 또, 제목도 굳이굳이 쉬운 말을 두곤 어려운 말을 써간다는 것이다. 만약 ‘향일규의 추악함’대신 ‘해바라기의 나쁜 모습’처럼 초등학교 1학년도 이해할 수 있을 정도의 제목을 덧붙였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분명 그냥 어린아이가 쓴 글이라며 넘겼을 것이다. 수필도, 소설도, 시도, 언제부터 어려운 말을 누가누가 더 많이 쓰냐 경쟁하는 것이었나? 어렵고 이해하기 힘든 말만 가득하면 정작 그 본래 전하고 싶었던 의미는 퇴색될 뿐이고 마음에 여운을 주는 일 따윈 없다. 그러나, 6살짜리라도 이해할 수 있는 단어들로, 누구나 일상생활에서 쓰는 단어들만 사용했을지언정 전하고 싶었던 의미를 정확하게 전달할 수만 있다면 이세상 중 누군가는 그 글을 기억하게 된다. 이 글에 결론같은 건 없다. 어려운 단어들과 미형의 수식어로만 전할 수 있고 그러고 싶은 사람이 어딘가에는 존재할 테니 말이다.
댓글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