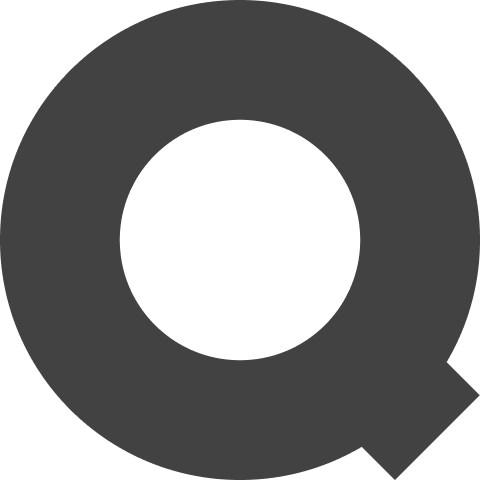[우물 안 개구리] 1
설정2025-08-08 00:19•조회 139•댓글 5•익명의 여잼민
새벽의 버스는 어제의 소란을 잊은듯이 조용하다. 지금 버스 안에는 40대쯤 되어 보이는 운전기사와 버스 창문에 기댄 채 꾸벅꾸벅 졸고 있는 한 사람, 서다.
세 시간 전, 서에게 한통의 문자가 왔다. 엄마가 폐암에 걸려 위독하다는 것과 급하게 수술비가 필요하다는 내용. 서에게 엄마란 그저 자신을 낳아준 존재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 낳아준 것만으로 감사하다는 것은 아무래도 거짓말이다. 세상은 그저 싸질렀을 뿐인 놈들도 부모라고 부른다. 싸놓고 감당이 불가능하니 가정을 버리고 도망간 존재. 서에게 엄마란 그런 존재였다. 그런 주제에 지 하나 살자고 자신이 버린 사람에게 문자를 보내는 짓은 불쾌하다. 그러나 그가 새로 낳은 아이들이 마음에 걸렸다. 그 애들, 얼굴도 나이도 모르지만 서는 그들에게서 어린 날의 자신을 느꼈다. 그리고 서는 그들을 도와줌으로써 그 누구도 구해주지 못했던 자신의 과거를 구원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 물론 서가 그들을 돕는다고 해서 자신의 과거가 나아지는 것은 아니다. 어쨌든 그것은 지나간 과거일 뿐이니까. 그렇지만 혹시나 하는 생각이 그의 발목을 잡았다. 혹시라도 과거에 누군가 날 도와줄 구원자가 있었더라면 나도 평범한 삶을 살 수 있었을까? 그렇게 서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 그토록 증오했던 엄마가 있는 한국대학교 병원으로 가게 되었다.
차가운 병실 안엔 소독약의 향과 분주한 발소리만이 맴돌고 있었다. 날 버리고 그동안 얼마나 잘 살고 있었나 했더니 결국 이렇게 살고 있었구나. 서는 어쩌면 그의 엄마만큼은 잘 살고 있었을거라 기대했을지도 모른다. 사실은 기대가 아니라 멋대로 생각했던 걸지도 모른다. 서는 엄마를 미워하고 싶었다. 그러나 그와 서 사이의 짧았던 봄들이 서가 그런 생각을 하지 못하도록 막았다. 엄마가 떠나가기 전 서의 인생은 행복했었다. 적어도 서는 그 짧은 계절동안 엄마라는 꽃이 있음에 행복해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며 언젠가는 겨울이 오듯, 서는 엄마와 헤어져야만 했다. 그 이후 서의 인생은 기나긴 겨울의 연속이었다. 아빠는 엄마가 떠나간 것이 자신의 잘못이라 믿었다. 그리고 그 믿음이 그가 천천히 우울속으로 빠지게 만들었다. 그런 그에게 서는 살아가야할 이유이자 마지막으로 자신에게 남은 것이었다. 서 또한 마찬가지였다. 이제 자신에게 남은 것은 아빠뿐이었다.
엄마가 떠나고서 멈췄던 것 같았던 계절도 어느순간 흘러가기 시작한 듯, 서는 겨울에서 가을로, 초등학생에서 중학생이 되었다. 그리고 그제서야 그는 자신이 다른 아이들과는 조금 다르다는 것이 실감나기 시작했다. 자신에겐 아빠를 제외하곤 아무것도 없었다. 엄마도, 멋진 집도, 하찮은 꿈조차 서와는 어울리지 않는 것이었다. 이상하다. 왜 나뿐인거지? 왜 나만 아무것도 없는걸까? 서에게 자기 자신은 텅 빈 존재였고, 따듯한 것으로 그 공백을 채우고 싶었다. 하지만 평생 따뜻함을 느껴보지도 못한 것처럼 서는 차갑고 부정적인 생각들로 자신을 채워갔다. 빈틈없이. 그리고 그 완벽한 채움은, 텅 빈 것보다도 더 고요히, 더 서늘하게 자신을 무너뜨렸다.
[서]
병원으로 오는 동안 문자를 봤다. 차가운 화면 속에서는 모르는 번호가 엄마의 삶을 말해주듯 폐암과 어린 아이들 따위의 단어들로 빛나고 있있다. 적어도 안부인사만큼은 직접 할 줄 알았는데.. 하고 실망했던 것도 잠시, 버스는 금세 나의 자리를 되찾아 주었다. 대학교 병원. 이곳이 그녀가 있는 곳이다. 안내표를 확인해 보니 암 병동은 7층이었는데 아무래도 엘리베이터 안은 내 자리가 아닌 듯 했다. 벌써 3번이나 놓친 엘리베이터는 야속하게도 지하 3층에서 올라올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었다.
한 계단 또 한 계단을 그리고 한 층을 올라가는 동안 내 심장 박동도 한 계단, 한 계단을 거듭하며 점점 빨리 뛰고 있었다. 이런 내가 우스웠다. 무엇 때문에 이렇게 긴장한 것이지? 왜 내 심장은 8층짜리 오피스텔을 택배까지 들고 단숨에 뛰어 올라갔을 때보다 더 긴박하게 뛰는 것이지? 생각이 멈추지 않는 쓰나미처럼 나에게로 몰려왔다. 드디어 6층,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7층이 나에게 닥쳐왔다. 마냥 멀게만 느껴졌던 엄마와의 만남이 임박하자 내 심장은 더 힘차게 뛰기 시작했다.
암 병동의 복도는 가족 혹은 지인의 병문안을 보러 온 사람들의 슬픔이 공기가 되어 공간을 짓누르고 있었다. 사뭇 긴장이 되어 심호흡을 하자 그 공기가 내 몸 안으로 들어와 폐를 거쳐 온 몸으로 퍼져나갔다. 동시에 손 끝으로 느껴지는 저릿한 감각, 그제야 내가 무슨 정신으로 이곳에 왔는지 후회가 몰려왔다. 사실 난 이제 갓 성인이 된 아직은 미성숙한 사람일 뿐이다. 털어도 10원 하나 안 나오는 빈털터리지만 지켜야 한다는 의무감으로 이곳에 왔을 뿐, 무언가를 생각한 건 없었다.
문자에서는 엄마가 입원해 있는 병실을 알려주지 않았다. 프론트엔 사람이 너무 많았다. 번호표를 뽑고 병원 복도에 기대어 숨을 돌리니 이 상황이 우스웠다. 어렸을 때는 그토록 만나기를 원했던 엄마가 이젠 조금이라도 더 늦게 만나서 안도하는 존재가 되다니. 번호표에 써 있는 숫자는 388번이었고 지금 불린 번호는 320번이다. 얼마 남지 않은 순서가 언젠가는 엄마를 만나야만 한다는 사실을 상기시켜 주려는 듯해 속이 울렁거렸다. 그 순간 복도에 기대어 선 채 입을 벌리고 있는 검은색 가방이 눈에 들어왔다. 살짝 열린 가방의 안쪽에는 구불구불한 내장처럼 겹겹이 쌓인 바이올린 악보들이 들어있었다. 울렁거리는 속을 달래려 맨 앞에 꽂혀져 있던 악보 하나를 펼쳐 보니 크게 적힌 곡의 이름은 ‘모차르트 바이올린 소나타 K.304’. 난 언제나 가방 안에 바이올린 악보를 넣고 다녔다. 이미 수백번 연습해서 다 외운, 이제는 이름만 보더라도 저절로 곡의 선율이 떠오르는 낡고 익숙한 악보들이다. 그렇지만 그것들을 읽다 보면 마치 내가 바이올린을 연주하고 있는 듯 안정감이 들었다. 난 바이올린이 좋다. 바이올린을 연주할 때만이 내가 나인 것 같은 해방감을 준다. 그렇지만 사실 처음 바이올린을 시작했을 때만 해도 나에게 바이올린이란 그저 나의 결핍을 채워 줄 무언가에 불과했다.
세 시간 전, 서에게 한통의 문자가 왔다. 엄마가 폐암에 걸려 위독하다는 것과 급하게 수술비가 필요하다는 내용. 서에게 엄마란 그저 자신을 낳아준 존재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 낳아준 것만으로 감사하다는 것은 아무래도 거짓말이다. 세상은 그저 싸질렀을 뿐인 놈들도 부모라고 부른다. 싸놓고 감당이 불가능하니 가정을 버리고 도망간 존재. 서에게 엄마란 그런 존재였다. 그런 주제에 지 하나 살자고 자신이 버린 사람에게 문자를 보내는 짓은 불쾌하다. 그러나 그가 새로 낳은 아이들이 마음에 걸렸다. 그 애들, 얼굴도 나이도 모르지만 서는 그들에게서 어린 날의 자신을 느꼈다. 그리고 서는 그들을 도와줌으로써 그 누구도 구해주지 못했던 자신의 과거를 구원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 물론 서가 그들을 돕는다고 해서 자신의 과거가 나아지는 것은 아니다. 어쨌든 그것은 지나간 과거일 뿐이니까. 그렇지만 혹시나 하는 생각이 그의 발목을 잡았다. 혹시라도 과거에 누군가 날 도와줄 구원자가 있었더라면 나도 평범한 삶을 살 수 있었을까? 그렇게 서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 그토록 증오했던 엄마가 있는 한국대학교 병원으로 가게 되었다.
차가운 병실 안엔 소독약의 향과 분주한 발소리만이 맴돌고 있었다. 날 버리고 그동안 얼마나 잘 살고 있었나 했더니 결국 이렇게 살고 있었구나. 서는 어쩌면 그의 엄마만큼은 잘 살고 있었을거라 기대했을지도 모른다. 사실은 기대가 아니라 멋대로 생각했던 걸지도 모른다. 서는 엄마를 미워하고 싶었다. 그러나 그와 서 사이의 짧았던 봄들이 서가 그런 생각을 하지 못하도록 막았다. 엄마가 떠나가기 전 서의 인생은 행복했었다. 적어도 서는 그 짧은 계절동안 엄마라는 꽃이 있음에 행복해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며 언젠가는 겨울이 오듯, 서는 엄마와 헤어져야만 했다. 그 이후 서의 인생은 기나긴 겨울의 연속이었다. 아빠는 엄마가 떠나간 것이 자신의 잘못이라 믿었다. 그리고 그 믿음이 그가 천천히 우울속으로 빠지게 만들었다. 그런 그에게 서는 살아가야할 이유이자 마지막으로 자신에게 남은 것이었다. 서 또한 마찬가지였다. 이제 자신에게 남은 것은 아빠뿐이었다.
엄마가 떠나고서 멈췄던 것 같았던 계절도 어느순간 흘러가기 시작한 듯, 서는 겨울에서 가을로, 초등학생에서 중학생이 되었다. 그리고 그제서야 그는 자신이 다른 아이들과는 조금 다르다는 것이 실감나기 시작했다. 자신에겐 아빠를 제외하곤 아무것도 없었다. 엄마도, 멋진 집도, 하찮은 꿈조차 서와는 어울리지 않는 것이었다. 이상하다. 왜 나뿐인거지? 왜 나만 아무것도 없는걸까? 서에게 자기 자신은 텅 빈 존재였고, 따듯한 것으로 그 공백을 채우고 싶었다. 하지만 평생 따뜻함을 느껴보지도 못한 것처럼 서는 차갑고 부정적인 생각들로 자신을 채워갔다. 빈틈없이. 그리고 그 완벽한 채움은, 텅 빈 것보다도 더 고요히, 더 서늘하게 자신을 무너뜨렸다.
[서]
병원으로 오는 동안 문자를 봤다. 차가운 화면 속에서는 모르는 번호가 엄마의 삶을 말해주듯 폐암과 어린 아이들 따위의 단어들로 빛나고 있있다. 적어도 안부인사만큼은 직접 할 줄 알았는데.. 하고 실망했던 것도 잠시, 버스는 금세 나의 자리를 되찾아 주었다. 대학교 병원. 이곳이 그녀가 있는 곳이다. 안내표를 확인해 보니 암 병동은 7층이었는데 아무래도 엘리베이터 안은 내 자리가 아닌 듯 했다. 벌써 3번이나 놓친 엘리베이터는 야속하게도 지하 3층에서 올라올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었다.
한 계단 또 한 계단을 그리고 한 층을 올라가는 동안 내 심장 박동도 한 계단, 한 계단을 거듭하며 점점 빨리 뛰고 있었다. 이런 내가 우스웠다. 무엇 때문에 이렇게 긴장한 것이지? 왜 내 심장은 8층짜리 오피스텔을 택배까지 들고 단숨에 뛰어 올라갔을 때보다 더 긴박하게 뛰는 것이지? 생각이 멈추지 않는 쓰나미처럼 나에게로 몰려왔다. 드디어 6층,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7층이 나에게 닥쳐왔다. 마냥 멀게만 느껴졌던 엄마와의 만남이 임박하자 내 심장은 더 힘차게 뛰기 시작했다.
암 병동의 복도는 가족 혹은 지인의 병문안을 보러 온 사람들의 슬픔이 공기가 되어 공간을 짓누르고 있었다. 사뭇 긴장이 되어 심호흡을 하자 그 공기가 내 몸 안으로 들어와 폐를 거쳐 온 몸으로 퍼져나갔다. 동시에 손 끝으로 느껴지는 저릿한 감각, 그제야 내가 무슨 정신으로 이곳에 왔는지 후회가 몰려왔다. 사실 난 이제 갓 성인이 된 아직은 미성숙한 사람일 뿐이다. 털어도 10원 하나 안 나오는 빈털터리지만 지켜야 한다는 의무감으로 이곳에 왔을 뿐, 무언가를 생각한 건 없었다.
문자에서는 엄마가 입원해 있는 병실을 알려주지 않았다. 프론트엔 사람이 너무 많았다. 번호표를 뽑고 병원 복도에 기대어 숨을 돌리니 이 상황이 우스웠다. 어렸을 때는 그토록 만나기를 원했던 엄마가 이젠 조금이라도 더 늦게 만나서 안도하는 존재가 되다니. 번호표에 써 있는 숫자는 388번이었고 지금 불린 번호는 320번이다. 얼마 남지 않은 순서가 언젠가는 엄마를 만나야만 한다는 사실을 상기시켜 주려는 듯해 속이 울렁거렸다. 그 순간 복도에 기대어 선 채 입을 벌리고 있는 검은색 가방이 눈에 들어왔다. 살짝 열린 가방의 안쪽에는 구불구불한 내장처럼 겹겹이 쌓인 바이올린 악보들이 들어있었다. 울렁거리는 속을 달래려 맨 앞에 꽂혀져 있던 악보 하나를 펼쳐 보니 크게 적힌 곡의 이름은 ‘모차르트 바이올린 소나타 K.304’. 난 언제나 가방 안에 바이올린 악보를 넣고 다녔다. 이미 수백번 연습해서 다 외운, 이제는 이름만 보더라도 저절로 곡의 선율이 떠오르는 낡고 익숙한 악보들이다. 그렇지만 그것들을 읽다 보면 마치 내가 바이올린을 연주하고 있는 듯 안정감이 들었다. 난 바이올린이 좋다. 바이올린을 연주할 때만이 내가 나인 것 같은 해방감을 준다. 그렇지만 사실 처음 바이올린을 시작했을 때만 해도 나에게 바이올린이란 그저 나의 결핍을 채워 줄 무언가에 불과했다.
댓글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